<이 미친 그리움> 림태주 지음 | 예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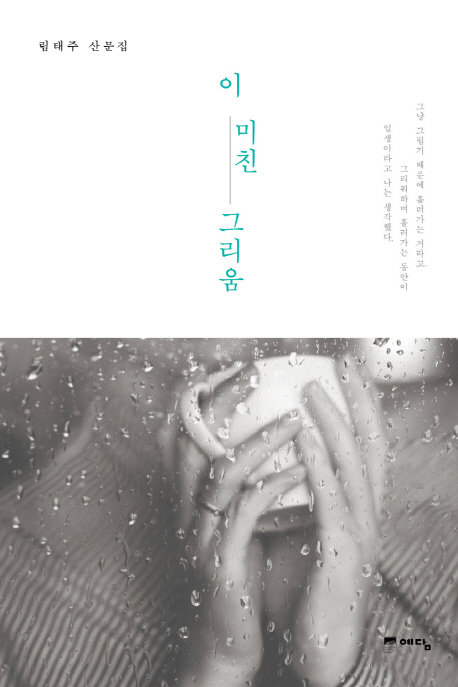
[화이트페이퍼=박세리 기자] 림태주 시인은 자신을 선생 ‘님’ 말고 “태주 씨”라 불러주길 바란다. 이왕이면 “보고 싶은 태주 씨”가 제일 듣고 싶다며 <이 미친 그리움>(예담.2014)에 보드라운 봄볕처럼 쓰다듬어주고 싶은 호칭이라 덧붙였다.
그가 ‘님’ 대신 ‘씨’를 붙여 달라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요즘 ‘~님’이라는 호칭은 본디 의미보다 거품이 잔뜩 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사례를 들었다.
한때 어느 야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씨’라 호칭해서 막말 파문이 일어난 바 있다. 이에 당시 인하대 최원식 교수가 ‘씨’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통렬한 글을 남겼는데 내용은 이렇다.
원래 ‘씨(氏)’는 막말이 아니라 대접하는 말이다. 한국처럼 존비법이 발달한 일본도 우리말 ‘씨’에 해당하는 ‘상(さん)’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한다. 수상에게도 ‘아베 상’이라 부르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말도 그랬다. 원래 ‘선생님’보다 ‘선생’이 훨씬 격이 높았다. 백범 김구 선생이 ‘선생님’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도 ‘장군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궁중에서도 지존에게 ‘상감마마’ ‘대비마마’라며 ‘마마’를 붙이지만, 상궁에게는 ‘님’을 붙여 ‘마마님’이라 불렀다. 한마디로 ‘님’자를 붙이면 한 수 아래가 된다는 설명이다.
우리가 존칭이라 여기며 습관적으로 붙여온 ‘님’, 좀 더 애교스럽게 부르는 ‘쌤’은 그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호칭이지 본래 쓰임과는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