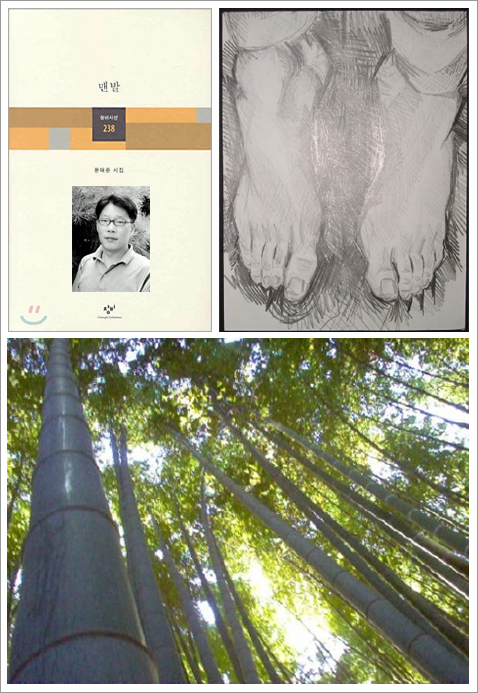
도서출판 작가에서 국내 문인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 오늘의 시`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에 이어 `가장 좋은 시인`으로 인기를 한 몸에 받은 불교방송 PD. 시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시집은 백석의 ‘사슴’이지만 이번 조사에서 `가장 좋은 시`로 뽑힌 `가재미`와 `가장 좋은 시집`으로 선정된 `맨발`의 작가.
게다가 올 미당문학상까지 수상하였으니 속된말로 4연타석 홈런을 친 문태준 시인. 수상작 ‘누가 울고 간다’에서 시인은 “나는 외따롭고 생각은 머츰하다”고 말한다. 밤새 잘그랑거리던 눈이 그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외지고 생각이 잠시 뜸해지는가 보다.
진이정 시인은 “토씨 하나 찾아 천지를 도는” 게 시인이라고 하였는데, 갈고 다듬어진 그의 시어 앞에서 잠시 머츰해진다. 써레가 지나간 무논에 흙물 가라앉듯 시인은 소란 뒤 침묵의 풍경에 조심스레 발을 디딘다. `맨발`(2004.창비)을 내딛는 시인의 숨소리가 일렁인다.
“꽃이 피고 지는 그 사이를/한 호흡이라 부르자/....../예순 갑자를 돌아나온 아버지처럼/그 홍역 같은 삶을 한 호흡이라 부르자” (‘한 호흡’중에서)
여울이 에돌아 흐르듯 예순 갑자를 돌아온 아버지, 시인은 아버지의 수런거리던 삶의 뒤란으로 들어가 부르튼 맨발을 어루만진다.
“어물전 개조개 한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늘 맨발이었을 것이다/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움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아-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맨발’중에서)
아-하고 울던 것 중의 하나였을 시인은 어렸을 적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힘겨운 부리를 떠올리고는 가슴 아파한다.
"작은 언덕에 사방으로 열린 집이 있었다/낮에 흩어졌던 새들이 큰 팽나무에 날아와 앉았다/한놈 한놈 한곳을 향해 웅크려 있다/일제히 응시하는 것들은 구슬프고 무섭다" (`팽나무 식구`중에서)
팽나무 위에서 밤낮으로 먹이를 물어오는 어미 물총새처럼 아버지는 자신만의 쨍한 사랑의 노래를 짓고 있다.
“봄이 되면 자꾸 세상이 술렁거려 냄새도 넌출처럼 번져가는 것이었다/똥장군을 진 아버지가 건너가던 배꽃 고운 길이 자꾸 보이는 것이었다/....../그러곤 하얀 배밭 언덕 호박 자리에 그 냄새를 부어 호박넌출을 키우는 것이었다/봄이 되면 세상이 술렁거려 나는 아직도 봄은 배꽃 고운 들길을 가던 기다란 냄새의 넌출 같기만 한 것이었다” (‘배꽃 고운 길’중에서)
똥장군을 진 아버지에게서 고운 배꽃 내음이 난다. 시인에게 아버지는 박지원의 `예덕선생전`에 나오는 예덕선생처럼 향기로운 사람이다. 그리하여 그 무섭고 구슬픈 추억들은 그리움으로 솟구쳐 오르기도 한다.
“그립다는 것은 당신이 조개처럼 아주 천천히 뻘흙을 토해내고 있다는 말//그립다는 것은 당신이 언젠가 돌로 풀을 눌러놓았었다는 얘기//그 풀들이 돌을 슬쩍슬쩍 밀어올리고 있다는 얘기//풀들이 물컹물컹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얘기”( ‘뻘 같은 그리움’)
시인은 초록의 풀들로 자라고, 아버지는 한 그루 산수유나무가 되어 아직도 풀을 감싸주는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트리고 있다/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나무는 그늘을 그냥 드리우는 게 아니다/그늘 또한 나무의 한해 농사/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다섯 되 무게의 그늘이다” (‘산수유나무의 농사’)
하지만 손톱처럼 자라는 유년의 서글픔을 매만져 보는 시인의 가슴에 흰 자두꽃이 아슴아슴하게 내린다.
“자두나무가 하얀 자두꽃을 처량하게 바라보는 그 서글픈 나무 아래/곧 가고 없어 머무르는 것조차 없는 이 무정한 한낮에/나는 이 생애에서 딱 한번 굵은 손뼈마디 같은 가족과 나의 손톱을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다”(‘흰 자두꽃’중에서)
그래서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간인 오후 4시는 시인에게 “아주 슬픈 시간”이다. 그러나 시인은 아이의 손톱을 깎으면서 아버지의 호흡과 아이의 호흡, 그 ‘사이’에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큼하고도 오묘한 살구 내음을 맡는다.
“외떨어져 살아도 좋을 일/마루에 앉아 신록에 막 비 듣는 것 보네/....../나는 오글오글 떼지어 놀다 돌아온/아이의 손톱을 깎네/모시조개가 모래를 뱉어놓은 것 같은 손톱을 깎네/....../내가 만질 수 없었던 것들/앞으로도 내가 만질 수 없는 것들/살구꽃은 어느새 푸른 살구 열매를 맺고/이 사이/이 사이를 오로지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시간의 혀끝에서/뭉긋이 느껴지는 슬프도록 이상한 이 맛을” (‘살구꽃은 어느새 푸른 살구 열매를 맺고’중에서)
이쯤해서 시인도 그 맛에 맞는 토씨를 찾지 못한 듯 하다. 아니 어쩌면 한 호흡을 마칠 때 까지 찾지 못할 지도 모르겠다. 톡 쏘는 새콤한 살구에 찡하여 시인은 옛날 수런거리던 뒤란으로 다시 들어간다. 산죽도 마음도 소란했던 뒤란에서 시인은 이제 떠나고 오는 바람의 ‘호흡’을 담담히 읽는다.
“장독대 뒤편 대나무 가득한 뒤란/떠나고 이르는 바람의 숨결을/空寂과 波瀾을 동시에 읽어낼 줄 안 이 누구였을까/한채 집이 할머니 귓속처럼 오래 단련되어도/이 집 뒤란으로는 바람도 우체부처럼 오는 것이니/아, 그 먼 곳서 오는 반가운 이의 소식을 기다려/누군가 공중에 이처럼 푸른 여울을 올려놓은 것이다” (‘대나무숲이 있는 뒤란’중에서)
그 호흡 속에, 처음도 끝도 없이 에돌아 에돌아나가는, 적요와 파문이 잔잔히 녹아있는 푸른 여울이 엇갈리며 흘러간다. 그 깊은 여울에 ‘맨발’을 드리우고 싶다.
[북데일리 김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