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프페이퍼-북데일리]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설을 꿈꾼다. 작가나 소설가를 지망자 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렇다. 작법에 대한 강의를 듣는 대신 책을 사서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나 독자 중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구매한 책은 김연수의 산문집 <소설가의 일>(문학동네.2014)이 아닐까 싶다. 책은 김연수의 일상과 함께 소설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다음은 소설의 문장을 옷의 역할로 비유한 구체적인 예로 설명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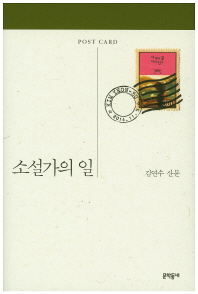
소설의 문장은 옷과 같은 일을 한다. 처음에는 날것의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쓰여진다. 욕망의 문장을 써보다. “그놈을 정말 미워 죽이겠어!” 라고도 우리는 말하지 못한다. 그건 완전히 날것의 욕망이니까. 배운 인간이라면 “그놈이 미워 죽겠어!” 라고 말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건 나뭇잎으로 주요 부위만 가린 꼴이다. 그걸 옷이라고 부를 수 없듯이, 밉다고 그놈이 미우 죽겠다고 쓰는 것을 소설의 문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적어도 “어쩜 얼굴이 저렇게 못생겼을까?” 정도는 써야 소설의 문장이다. 물론 이것도 그저 바지저고리나 걸친 꼴이지 어디 내세울 만한 옷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아래의 문장 정도로는 써 주셔야 어디 남들 앞에 입고 나갈 옷 정도는 되겠다. 『안나 카레니나』의 한 구절이다.
페테르부르크에서 기차가 멈추자마자 그녀는 내렸다. 맨 처음 그녀의 눈에 띈 것은 남편의 얼굴이었다. '세상에! 어째서 저이의 귀는 저렇게 생겼을까?' 그녀는 그의 싸늘하고 위엄 있는 풍채와 무엇보다도 지금 그녀를 놀라게 한, 둥근 모자 테두리를 받치고 있는 귀의 연골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남편놈이 미워 죽엤어!” 라는 건 안나의 욕망이지만, 톨스토이는 이 욕망을 갑자기 안나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귀의 연골부로 표현했다. 이런 문장은 멋진 옷을 입는 것 같은 짜릿함을 독자에게 안겨준다. 멋진 표현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좋은 소설이라면 욕망을 감추는 그 문장 자체가 이처럼 기발하고 멋져야 한다. (114~115쪽, 일부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