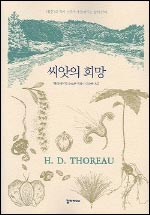
어둡고 그늘진 독재자 세상에서는 돈으로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맺히는 때라, 공장도 차리고 회사도 차려서 돈벌이만 했는데, 이제는 마음 놓고 농사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으리라 믿은 셈이지요. 그런데 그 뒤로 스물여섯 해가 지난 지금은, 그 시골마저도 논밭과 산과 들이 찻길로 깎여나가고 공장이 들어선다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날이 물과 공기가 더러워지고 인심 사나운 도시내기들이 온 땅을 물들여서 세상 참 끔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봐도 뿌옇기만 할 뿐, 해맑던 파란빛이 사라졌습니다. 무지개도 은하수도 할미꽃도 사라졌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농사꾼이 몇 차례씩 풀약을 쳐서 온 땅 풀을 다 죽인 밭에서 끝끝내 다시 뿌리내리고 줄기를 올리는 온갖 풀을 보며, “야, 아무리 사람이 발악을 해도 저렇게 다시 자라는 풀을 보니, 땅을 보니, 희망이 있구나.” 하면서 웃기도 합니다.
희망이란 어디에 있을까요? 글쎄, 저는 이 희망이란 우리들 몸과 마음에 두루 있다고 느끼는데. 다만, 이 희망을 알아채고 느끼고 받아들여서 널리 펼치거나 즐기려는 사람이 드물 뿐이지 싶습니다. 땅을 보며, 잿빛 하늘을 나는 닭 같은 비둘기를 보며, 다람쥐까지 잡아먹는 날다람쥐를 보며, 미친 듯 내달리는 도심지 자동차를 보며, 내 발을 밟고도 미안하다는 말없이 쌩 지나가는 사람을 보며, 길바닥 아무 데나 침 칵 뱉는 사람을 보며, 희망을 찾을 수도 있겠지요. 이런 모든 모습들을 옳은 쪽으로 돌리고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힘쓰면서 보람을 찾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우리들 누구한테나 있는 희망을 책에서 찾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돈-이름-힘, 이 세 가지에 치우치고 파묻히는 책이 늘고 있지만, 이런 틈바구니에서, 그러니까 돈-이름-힘으로 서로가 서로를 해코지하고 괴롭히는 세상에서, 도우며 살기보다는 등 처먹고 살고자 바둥거리는 흐름에서도 ‘누군가 알아주리라 믿는다. 틀림없이 언젠가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작은 힘을 모아 곧은 마음을 살뜰히 담은 책 하나 꿋꿋하게 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책을 하나둘 찾아서 읽고, 이렇게 애쓰는 분들을 한 분 두 분 만나며 이야기를 듣고 배우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도 주고받으면서 조그마한 풀씨를 이 거친 땅에 뿌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산과 들을 돌아다니면서 살피면 ‘못 먹는 풀’보다 ‘먹을 수 있는 풀’이 더 많아요. 약풀도 가만히 보면 참 흔한 풀이기 일쑤입니다. 채식, ‘풀먹기’가 좋은 까닭은 그 흔하고 너른 풀이 다 약풀이기 때문이구나 싶습니다. 밥이 약이고, 약이 밥이기도 하니까요. 그래, 우리가 차근차근 틈을 내어서 찾아보는 책 한 권도 이런 들풀이나 약풀 같다고, 들풀이나 약풀 같은 책을 찾아서 보면 좋다고 느낍니다. 들풀 같은 책, 약풀 같은 책, 그러니까 밥 같은 책이라 할까요. 이 어둡고 메마른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기도 하고 따뜻하게 감싸는 이불이기도 하는 책이라 할까요.
요즘 <헨리 데이빗 소로우-씨앗의 희망>(갈라파고스. 2004)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자연은 이 나무를 퍼뜨리는 데 관심이 많았던지 배와 그 씨앗을 잘 보관해 주었던 듯하다.(106쪽)”란 말을 읽고 무릎을 탁 칩니다. 배나무뿐 아니라 능금나무, 귤나무, 포도나무, 딸기나무 모두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씨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자라나거든요. 우리는 ‘어린나무’를 심어서 거둔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세상 그 어느 나무도 우리 손톱보다도 작은 씨앗에서 자라났어요. 우리가 어린나무를 심지 않아도 자라는 나무이고, 예전부터 자라온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와 모습과 삶을 가르치거나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어디에 있기나 할까요.
지난날처럼 산과 들과 내와 바다가 집이자 마을이고 벗이자 스승이었던 때에는 따로 책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를 깨닫고 즐겁게 살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지요? 병원에서 태어나 시멘트굴에서 살며 학교를 다니는 동안 ‘나다움’, ‘사람다움’, ‘자연스러움’ 모두 잃거나 잊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 또한 이런 도시에 무슨 꿈이 있나, 길이 있나 하고 한숨을 쉬며 걱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씨앗의 희망> 같은 책을 뜻밖에 만나고는, 온갖 보물 같은 책, 풀씨 같은 책도 꾸준히 만나면서, ‘이렇게 책 하나로도 세상을 깨닫고 자연을 느끼며 희망을 품을 수 있겠구나. 이 희망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느껴요.
그리하여, 책 하나 읽으며 한 가지씩 배운 뒤, 이렇게 배운 앎을 하나씩 실천으로 옮기는 가운데, 잊거나 잃고 있던 ‘나-사람-자연’을 살그머니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깨운 뒤에는 참답고 깨끗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일, 또 이웃과 이 모든 고마움을 함께하는 일을 찾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일이라면 ‘책 안’에서만이 아니라 ‘책 밖’에서, 그러니까 산과 들과 내와 바다에서 놀고 일하고 부대끼면서 자기 삶을 찾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이렇게 책 하나로 우리를 살찌우고 눈을 틔우는 이야기를 ‘책 안’에서라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만난 이야기를 소중히 간직하면서 ‘책 밖’으로도 부지런히 나와서 자기 둘레라도 돌아볼 수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책읽기를 즐거움으로 삼으며, 책읽기로 얻거나 느낀 즐거움을 우리 세상에서 펼치거나 나누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