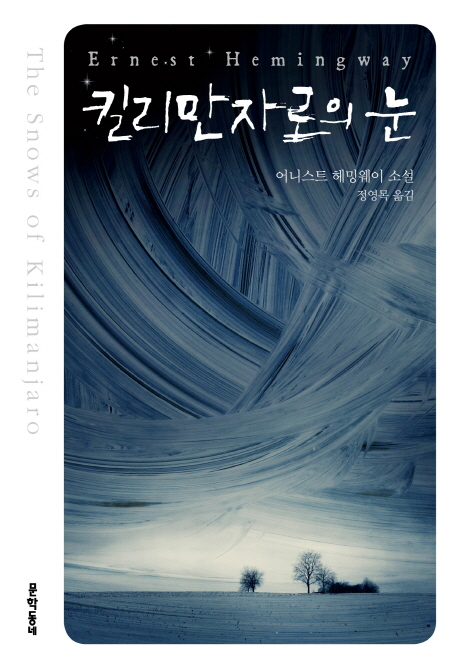
[북데일리]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에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 이라고 말했다. 한데 <킬리만자로의 눈>(2012. 문학동네)엔 죽음이 가득하다. 육체와 영혼을 갉아먹는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죽음이라고 말한다.
표제작인 「킬리만자로의 눈」 은 아프리카에서 곧 자신이 죽을 거라 예감한 남자 해리의 이야기다. 그는 상처를 바로 치료하지 않아 괴사하는 다리의 통증과 싸우고 있다. 연인은 그에게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려 애쓰며 그에게 죽음이 아닌 생을 말한다. 사랑하는 여인을 곁에 두고 그녀와 보낸 시간을 추억하지만 오로지 그가 원하는 건 죽음이다. 아니, 그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것에 그는 호기심이 거의 없었다. 오랫동안 이것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 이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냥 적당히 피로해지는 것만으로도 쉽게 이렇게 될 수 있다니 신기했다.’ <p. 13~14 - 킬리만자로의 눈>
‘좋아. 이제 그는 죽음을 개의치 않기로 했다. 한 가지 그가 늘 두려워하던 것은 통증이었다. 사실 그는 누구 못지않게 통증을 잘 견딜 수 있었다. 너무 오래 계속되어 완전히 지치게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겁이 날 만큼 아팠으며, 막 그것 때문에 무너질 것 같다고 느꼈을 때 통증은 중단되었다.’ <p. 48 - 킬리만자로의 눈 >
해리는 통증과 죽음 사이에서 결국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아프리카에서 맞는 죽음을 맞는 해리에서 헤밍웨이를 본다. 해리가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처럼 그는 생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일까. 「프랜시스머콤버의 짧고 행복한 삶」에서 마주한 죽음은 욕망의 댓가였다. 사냥을 나선 아프리카에서 머콤버가 죽이고 싶었던 건 사자나 물소가 아니라 욕망이라는 허울과 비겁한 삶이었다. 아내 역시 그러했다. 신물이 나는 삶이 아닌 진짜 삶을 원했던 것이다. 그것이 죽음을 불러올지라도 말이다.
소설에 죽음만 있는 건 아니다. 그리움과 추억이 있다. 주인공 닉이 홀로 야영을 하며 숭어를 잡으며 친구들을 추억하는 「심장이 둘은 큰 강 1, 2부」, 시체로 둘러싸인 부대를 빠져 나오는 「가지 못한 길」, 친구 빌과 여자친구 마저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흘간의 바람」, 「어떤 일의 끝」은 아릿해서 아프다. 과거에 함께 했지만 지금은 곁에 없는 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이 아닌 연작 소설을 읽는 맛을 느낄 수 있다.
공허하고 서늘한 기운이 가득한 소설들이다. 책은 「킬리만자로의 눈」에서 해리의 죽음으로 시작하여 「인디언 마을」에서 죽음으로 마무리 한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음에서 시작하여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으로 끝난다. 의사인 아버지를 따라 인디언 마을에서 생명의 탄생을 지켜보는 닉은 동시에 자살한 모습을 마주한다.
“죽는 게 힘든가요, 아버지?”
“아니, 내 생각에는 아주 쉬운 것 같구나, 닉.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들은 보트에 앉아 있었다. 닉이 고물에 앉고 아버지가 노를 잡았다. 언덕 뒤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농어 한 마리가 튀어 오르자 물에 둥근 파문이 일었다. 닉은 보트 뒤쪽에 손을 담가 물살을 갈랐다. 아침의 싸늘한 냉기 때문인지 물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닉은 이른 아침 오후에서 아버지가 노를 젓는 보트 고물에 앉아 자신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 <p. 320~321 - 인디언 마을>
죽음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믿는 젊은 닉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해리의 모습이 교차한다. 죽음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을 살고 있다고 소설을 말한다. 그러니 우리는 그 생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